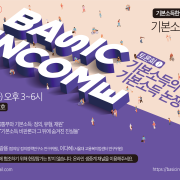[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by 신지혜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제1야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고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