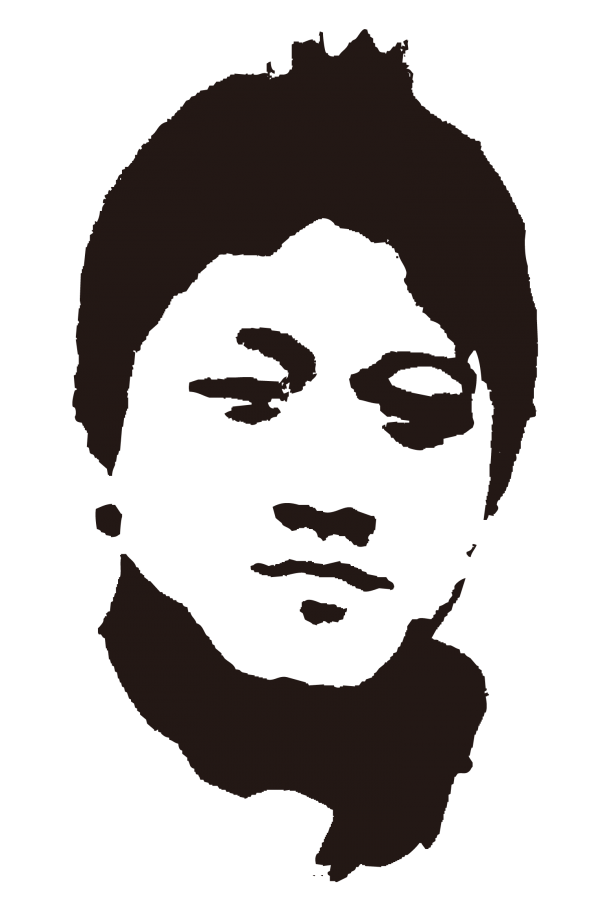[추모사]
사회운동가 권문석을 추모하며
— 여덟번째 권문석 추모제에 부치는 글
이제 시간이 흘러 권문석 동지를 알고 지내던 시간보다 그를 떠나보내고 지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길…
사실 유물론자로서 우리는 그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인간의 정리 그리고 사회운동의 의무 속에서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불러내고, 그는 또 우리를 끊임없이 부른다. 어떤 때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로, 또 어떤 때는 우리 시대 사회 운동의 근본적인 태도를 요구하면서 말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급진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태도.
권문석 동지가 우리를 떠난 계절은 묘하게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와 겹쳐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내년에도 1만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5년 전 정치적 변동과 뒤이은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졌던 희망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는 정치의 배신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이 정도 올리는 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좀 더 커다란 변화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실주의자가 되면서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개혁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권문석과 우리가 속하고 또 만들고자 했던 사회 운동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도정 위에 있다.
기본소득 의제는 최저임금의 운명에 비스듬히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던 때 기본소득은 겨우 의제가 되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기본소득이 정치적, 정책적 수준에서 제시되자 한편으로는 집중포화가 쏟아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승하려는 눈물겨운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이 대세이던 시절에 기본소득은 공포탄 이상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과 불가피하고 의도적인 경제 후퇴 속에서 기본소득은 이제 조명탄이 되어 돌아왔다. 우리 모두는 공유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추출주의적 자본주의는 우리가 살아갈 환경도, 우리 자신도 파괴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그 자체로도 재앙이지만, 더 큰 재앙의 리허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니 여기에 맞서는 긴급하고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은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당성과 필요성 둘 다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현실에서 납득할 만한 이런저런 설명 방식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소비 진작을 통한 승수 효과가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정신에서 멀어져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지시한 방향마저 상실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이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떠오르자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러저러한 정책이 세상에 나왔다. 어떤 것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붙잡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본소득의 정신과 방향에 공명하는 것도 있다.
어찌되었던 기본소득은 굴러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를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역사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왔던 길이고, 고비마다 우리가 했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권문석을 떠올리다면, 그가 우리 어깨에 손을 걸친다면 아마 우리가 이런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이리라.
이때 그가 하는 말은 ‘아직 멀었다’가 아닐까? 그가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간지 이제는 제법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를 잊기에도 아직 멀었다.